글: 최지현
올 봄 즈음에 나는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합류했다. 재단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당황했다. 차라리 잊고 있었다는 게 맞겠다. 본래 내가 지원서를 제출한 정초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던 까닭에, 나는 진작에 내가 떨어진 걸로만 알았기 때문이다.청년재단의 온라인 신청 폼에서 요구된 유일한 조건이 있었다. ‘비자립 상태에 있는 청년’일 것.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었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1) ‘아직 자립하지 않았다.‘ 혹은 (2) ’자립하기 전이다.‘와 (3) ’비자립 상태’에 있다, 는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린다. 앞의 두 가지 말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거나 또는 물리적/경제적 독립을 장래의 기정사실로 놓고 현재 상황의 일시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비자립 상태‘라는 말은 사태의 정적인 성질과 부동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흔히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어요(웃음)’ 라고 말할 때와는 달리 좀 더 묵직한 어조를 띤다.
자립이란 뭘까?
자신을 길러준 양육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살면 자립 상태에 있는 걸까? 아니, 그보다는 생활의 기반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날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생계의 원천이다. 만약 자립이 정신적 독립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부모를 포함한 어릴 때부터 의지해 온 권위적 존재로부터 일체의 정신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내가 속한 사회는 자립을 지극히 필수적이며 당연한 것,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향점으로 보고 있었다. ‘모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명제 뒤에 ‘그러므로 네 몫의 빵은 스스로 벌어라.’라는 말이 따라붙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존재하는 법. 어쨌거나 내가 행복하다면 그만인 것이다.문제는 정작 내가 부모에게 일체의 지원을 의지한 채로 살면서 행복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아버지가 흘린 피땀으로 산 치킨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닭다리를 집어들면서 나는 내심으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백수로 살다 보면 받게 되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 “너는 집에서 노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겠다.”라는 말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시 출근을 일상처럼 반복하는 꿀벌 같은 사람들이 무위도식하는 한량에게 느낄 법한 부러움이다. 말을 했던 사람이 뜻하는 바처럼 이쪽에서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말일수록 가시처럼 콕 하고 가슴 한 켠에 박혀서 오래토록 머리를 맴돌고, 또 여간하지 않고는 잘 빠지지 않는다. 슬픈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나는 부유한 한량이 아닌 관계로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면 점심을, 점심을 먹고 나면 이번에는 저녁엔 뭘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소일하며 보낼 수는 없었다. (러시아나 영국의 귀족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때 항상 12시쯤 느지막이 일어나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면 컴퓨터를 켜거나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은 비록 TV를 향해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먼 훗날의 미래를 포함해서 앞일에 대한 걱정으로 꽉 차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집콕’하던 동안 단 한시도 쉰 적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어쩌면 그런 걱정을 잊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목적도 희망도 없는 삶이었다. 나의 생활은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시종 우울했다. 최첨단 GPS는커녕 나침반도, 한 장의 지도마저도 없었던 나는 삶이라는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 있었다. 장래를 생각하라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니들이 뭘 알아? 난 오늘을 살기도 힘에 부치는데.
정말 뭘 하면 좋을지 몰랐다.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였다. 나는 뚜렷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채로, 이승과 명부의 경계에 서서 매일 조금씩 강물에 발을 적셨다. 과거에 내가 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포부와, 지나간 추억의 잔해를 곱씹으면서 지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흉내를 냈다.
꿈결처럼 흘러가 버린 나날들이었다.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젊음을 허비했다. 일어나서 숨을 한번 내쉬면 점심밥이 사라져 있고, 눈만 깜빡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잠 잘 시간이 돌아온다.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갔다. 그즈음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꿈꿨다. 이미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 먼지에서 티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허무.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뱉었던 탄식을 경구처럼 입에 올리며 살았다.한때나마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존재했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죽는 것 또한 그렇다. 결코,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이 현실에 좌절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도피처를 찾는 것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다. 그 증거로 내가 지금 새벽에 PC 앞에 앉아서 술도 안 마신 맨정신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아니, 수정하겠다. 나는 글을 마무리해 가는 지금도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혈전이 생기기에 딱 알맞은 자세로 죽음을 서서히 촉진시키고 있다.
다만 그것이 아주 더디게 진행될 뿐이다. 아마 나는 50년 뒤에 급성 심장질환으로 응급 이송되는 중에 앰뷸런스에서 마지막으로 노년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속마음을 고백하자면, 나는 그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정말로 그 존재가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은 사람 같은 건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도 살아도 된다‘는 일종의 승인을 받고 싶었다. 경원시 해 온 그들로부터 따스한 눈길과 애정 어린 포옹을 사실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우리는 “도살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고아와 과부는 짓밟히고 사방 도처에서 병자의 신음이 들려온다.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신음하고 있고, 똑똑한 이상주의자들이 화성에 로켓을 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범우주적인 차원으로 민폐를 확대시킬 기세다.
하지만 그 말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한 기대는 아직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온다. 그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음을 뜻한다.
내일이 더 나쁠 수도 있다. 물론 인정한다.
그렇다면 모레는, 글피는 어떨까? 지금 나는 삶이란 본디 신비로운 것으로, 사람의 일생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내일 병이나 사고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죽어 없어질 수 있음을 뜻하지만, 반대로 복권 당첨에 버금가는 운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꼭 재수 좋은 횡재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야바위꾼은 밑장을 빼거나 저울을 속이기도 하지만 신은 주사위 눈을 두고 장난치지 않는다. 확률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이다.기대를 버리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최근 1년 새에 몸소 느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하루 정도 밥을 굶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폭발적인 공복과 함께 위장에 음식물이 흘러들어갈 때 스스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Bokyum, 2017, After starving for 30 hours, I ate chicken right before I collapsed.) 그리고 다이어트와 수명 연장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찾는 것은 발견하는 사람의 몫인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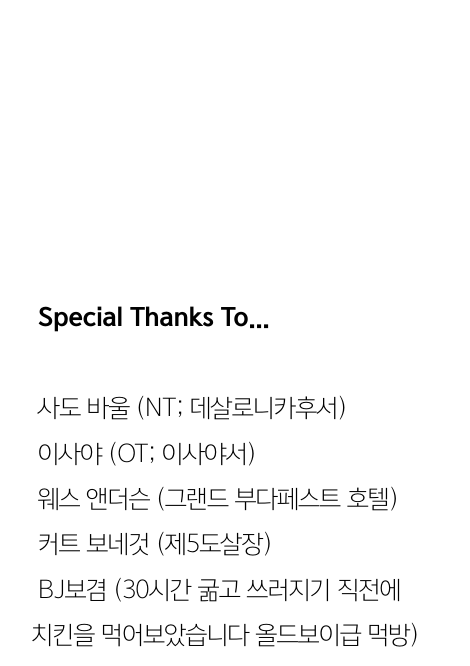

'1.내가 방을 나가지 않게 된 이유 > 청년체인지업 프로젝트 참가자 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애증, 나의 엄마 (0) | 2020.12.13 |
|---|---|
|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0) | 2020.12.13 |
| 수없는 도망 끝에 (0) | 2020.12.13 |
| 내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0) | 2020.12.13 |
| 더이상 한심하고 싶지 않아서 (0) | 2020.12.13 |



